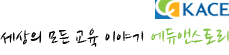봄맞이
|김경집| 완보완심 2013. 3. 22. 10:46어김없이 봄은 왔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북부에는
때 아닌 폭설이 내려
설악동에는 눈꽃이 만개했다지요?
서울에도 어제 그제 잠깐씩
어설픈 빗발과 풋눈이 섞여 내리더니
오늘은 영하의 날씨로 뚝 떨어졌습니다.
남쪽에는 매화니 동백이 활짝 폈고
산수유는 언덕과 마을을 온통 노랗게 물들이고 있다지만
여전히 서울은 꽃은커녕 봉오리조차 채 맺지 못한 봄꽃들이
입을 앙다물고 있으니
꽃샘추위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한,
3월 하순의 추위입니다.
삶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것을,
덧셈은 잊고 뺄셈에만
신경 곤두세우지는 않았는지
이 어색한 매운 봄바람이 일깨우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가끔
겨울의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을볕의 날씨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박하거나 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보이는
꽃샘추위에 대해서는 유난하게 타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 겨울을 기다리는 마음보다는
겨울에 대한 대비를 하는 처지에서
잠깐의 볕과 따뜻함은 고맙게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에 반해 매운 겨울 털고 고대하던 봄의 길목에서
심술궂게 찾아온 반짝 추위가 조금은 야속도 하겠지요.
하지만 자연은 시간의 길목에서 조금씩 엇박자를 둬서
우리에게 그냥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기다리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때론 굴곡도 있고 때론 너르게 뻗은 대로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조금만 아쉽고 매워도 야속하고 원망스럽지요.
그리고 정작 이따금씩 느끼는 행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게다가 그 행복이라는 것도 예전과 같은 것이면
도무지 만족하려하지 않지요.
조금 더 크고 많은 행복에만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행복도 복습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롤러코스트처럼 정신없이 치솟다가
곤두박질치는 삶은 버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에는 높낮이가 두루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잔망스럽게 조금만 오르면 희희낙락하고
잠깐 내려가도 호들갑 떠는 것을 보면
참 잔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겨울 유난히 맵고 길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잠깐 볕 날 때 정신줄 놓은
개나리 몇 봉오리쯤은 일찍 꽃을 내밀었다가
화들짝 놀라 질겁하던 일이 허다했는데,
올 겨울은 아예 한 녀석도 그런 것을 보지 못했으니
춥긴 어지간히 추웠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이 신산해서
더욱 그렇게 느껴졌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에 비례해서 봄의 희망과 기다림의 부피는
어느 때보다 더 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춥고 매운 날씨를 겪어봐야 볕의 따사로움이
그런데도 봄꽃은 예년보다 1주일쯤 일찍 핀다지요?
어쩌면 그리 매운 겨울 겪었기에,
꽃들도 그걸 이겨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서둘러 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봄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기특한 뜻이 담겨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올봄 꽃구경은 다른 해에 비해
느낌이 조금은 더 진할 듯합니다.
매운 겨울 이겨낸 기특함과 씩씩함을 확인하며
삶에서도 그런 가치들을 새삼 되살리고 싶을 테니 말입니다.
아직은 제대로 봄은 아닌 듯합니다.
그야말로 봄은 봄이되 봄 같지 않은 그런 때이지요.
전한(前漢) 말기 흉노의 선우에게
정략결혼으로 시집간 왕소군의 심정을 대신해
당나라 시인 동방규(東方虬)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노래한 것처럼,
시간으로는 봄이지만,
도무지 봄 같지 않으니 조금은 안타깝고
약간은 섭섭함이 느껴지는 그런 절기이지요.
그러나 어찌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어코 봄은 오게 마련이지요.
그게 자연의 질서이지요.
그런데도 조그만 돌덩이처럼 뜻하지 않은
자잘한 돌출에도 성마른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에게 사람 노릇 제대로 하라고
자연이 가르쳐주기 위해
꽃샘추위를 마련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힘든 일은 오래 기억하고 좋았던 일은 쉬 잊거나
더 좋은 일이 있어야 겨우 만족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성정이
이 꽃샘추위를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잠깐 따뜻해지는 건
탓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잠깐 추워지는 것에 예민해지는 건
공평한 일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꽃샘추위는
우리에게 삶의 겨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갈무리했는지 묻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저절로
봄의 꽃과 잎을 누리는 게 아니라
겨울의 신난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고마워하고 삶의 봄을 맞으라는 신호인 듯싶습니다.
이제 겨우내 옷장 속에
조용히 접어두었던 봄옷들을
하나씩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추위끝 때문에
겨울옷도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니 겨울과 봄이
너그럽게 공존하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고통과 소생의 극단적 대비가
두 계절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할 것 같지만,
자연은 그마저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그저 의례적인 소임의 교대가 아니라
봄은 겨울에게 모질어서 야속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더 진한 꽃 피우고
더 많은 잎을 낼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고 겨울은 봄에게 견뎌낸 힘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너그러움으로 교환함을 배워야겠습니다.
아직 바람끝이 매운데도
나무들은 이미 제 봉오리를 터뜨릴 채비를
마무리하고 있나봅니다.
겨울을 잊지 않아야 봄의 진가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음을
이 짧은 꽃샘추위의 시기에 곰곰 생각해봅니다.
야속했지만 고마운 겨울에게 애썼다고 도닥이기 위해
이 저녁 밖에 나가볼까 합니다.
두 계절의 화해를 축하하면서 말입니다.
'|김경집| 완보완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추가 왜 달라? (0) | 2013.09.03 |
|---|---|
| 지금은 행복을 복습하는 시간 (0) | 2013.05.22 |
| 새해 첫 날마다 쓰는 유서 (0) | 2013.01.23 |
| 뭉뚝한 칼의 지혜 (0) | 2013.01.16 |
| 왜 성찰이 요구되는가? (0) | 201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