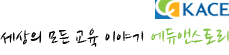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학교 가는 길’ 하면 떠오르는 것은 코스모스 줄지어진 신작로다. ‘신작로’, 어른들이 부르는 대로 새로 난 길을 그렇게 불렀다. 길이야 새로 냈지만 아스팔트가 귀할 때이니 누런 먼지가 폴폴 날리던 황톳길이었다. 그 길이 아직도 정겨운 것은 학교 앞부터 우리 집이 있는 춘천댐 발전소까지 피어있는 코스모스 때문이다. 집에서부터 코스모스만 따라 가도 능히 학교에 닿을 수 있었다. 하교길 코스모스 꽃길은 놀이터나 다름 없었다. 색색 꽃잎을 따서 손톱에 침 발라 붙이면 매니큐어 바른 것처럼 야한 손톱이 되었다. 성장을 한 숙녀가 된 양 친구들끼리 서로의 손톱에 찬사를 보이기도 했다.
꽃은 우리가 모종을 심어 자라 핀 것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 우리는 고사리 손으로 담임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모종을 심었다. 잘 자라 키가 크자 선생님께서는 또 우리들을 병아리처럼 쭉 몰고 가 순치기를 가르치셨다. 코스모스 목을 똑 하고 부러뜨리는 게 무척이나 아까웠으나 그렇게 순을 쳐야 꽃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나중에 보니 정말 가지가 많이 벌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코스모스와 함께 자연을 들여다보는 법도, 아깝지만 잘라야 하는 법도, 있는 것을 더욱 좋게 만드는 법도 보고 배웠다. 훗날 생각해보면 내가 늘 다정한 엄마지만 아이를 단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시민운동가로 지극히 공정하려 노력하며 사는 것의 바탕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윤강원 선생님이 계신다.
첫 학교, 첫 선생님 기억은 내게 언제나 새롭다. 모두가 가난한데다 시골이라 더욱 어려워 초등학교에 입학해보니 1학년은 교실도 없이 학교 운동장 한 쪽에 쳐진 시퍼런 군용 천막에서 공부를 했다. 사람들이 드나들 때 마다 차가운 봄바람이 함께 들어왔으나 그나마 그때는 빛이 들어와 어두컴컴한 실내가 밝아졌다. 교실에 앉아있으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천막 밖에서 손을 넣어 꼬집고 장난을 쳤다.
때론 ‘이게 무슨 학교람. 교실도 없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이 또한 재미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야외수업이 되었으며 날마다 밖으로 다니는 수업이었다. 돌개바람이 휘몰아치면 천막이 뒤집어지고 선생님께서 나눠 준 종이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다른 집, 밭으로 날아갔다. 아이들은 잘 되었다며 신나게 뛰어나가서 잡는다고 난리 아닌 난리가 났다. 망건을 쓴 밭주인은 곰방대를 물고 있다 뛰쳐 나와 아이들 몰아내느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우리는 좋게 보면 언제나 열린 학교에 다녔고 나쁘게 말하면 집 없는 거지처럼 떠돌아다녔다. 꽃이 피는 계절이 되었을 때는 들로 산으로 다니며 공부를 했다. 사실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지만 들꽃이 피어있는 낯모르는 사람 산소에 삥 둘러 앉아 선생님 말씀을 들은 기억도, 강가에서 있었던 기억도 있다. 따뜻해지면 햇살 아래 앉아 선생님 말씀을 옛 얘기처럼 들었다.
선생님 나이는 마흔 정도였는데 자그만 체구에 늘 뒷짐을 지고 다니셨다. 웃으면 볼에 예쁜 보조개가 생겼다. 늘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계셨다. 선생님께서는 날이 더워지자 아이들을 몰고 강가로 갔다. 조약돌을 주워다가 아이들 목 때를 밀어 씻겨주셨다. 한 아이 한 아이 반들거리는 조약돌로 씻기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선생님은 아직 어리광쟁이일 나이에 최소한의 보살핌도 못 받는 시골 아이들을 말없이 챙기셨다.
수업이 끝나면 항상 소사 아저씨와 학교 뒤쪽에 큰 솥을 걸어놓고 불을 지피고 계셨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으니 아이들이 너무나 가난하여 밥을 굶고 와 교실에 앉아서 졸고 있어 선생님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라도 먹여 보내려고 하시는 일이라고 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이 먹이는 일보다는 앞설 수 없다’며 직접 교육청에 가서 신청을 하여 겨우 옥수수가루를 얻어와 손수 죽을 끓여 먹이셨다. 학교가 파할 때 나는 그 옥수수죽 냄새는 아주 구수했다. 항상 웃고 따뜻한 선생님이지만 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내게 단 한 번도 죽 한 숟가락 주신 적이 없었다. ‘아, 맛있겠다.’ 하는 생각에 멀리서 쳐다는 봤지만 나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까봐, 혹시 주실까봐 부끄러워 한 번도 죽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런 날은 학교에 서성거리는 것도 송구스러워 바로 집으로 왔다.
학년 말, 하루는 교실 난로 옆에 앉게 되었는데 강이 다 얼도록 추운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발이 젖어 학교에 온 아이를 위해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하셨다. 춘천댐은 건설 현장이었기에 외자상자 같은 폐자재들이 많이 나와 아버지께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다르게 대하신 적이 없고 어린 아이지만 더 베풀게 가르치셨다. 누구에게나 웃는 낯으로 대하고 칭찬은 엄청나게 하고 나를 정말 예뻐하셨지만 특별대우는 없었다.
이런 기억으로 나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두려움이 없었다. 세상 삼라만상이 다 우리 아이를 키워주는 스승이므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고 그런 스승들을 만나 내 인생이 피어난다는 것도 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아이를 자연에 내 놓고 어떤 스승을 만나든 그 분의 좋은 점을 아이가 들여다보도록 거들어주었다.
윤강원 선생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더라.
*글:서형숙(엄마학교 저자)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정기 구독도 + ^ ^)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