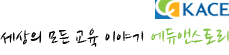최고은작가 후배가 쓴 글과 고 박완서 선생을 떠올리며
삶의 지혜와 감동 2011. 2. 9. 15:26
당신의 자녀가 작가나 사상가의 길을 걷게다고 하면?
미하엘 코르트가 쓴 ‘광기에 관한 잡학사전’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작가’(예술가, 사상가 총칭)가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시인이 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묵묵부답 당황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라는 것이 뚜렷한 직업도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야 난감하셨겠지요. 광기에 관한 잡학사전은 당대에 이름을 떨친 세계적인 작가들의 일화(에피소드)가 담겨있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괴팍했단 말인가?
미하엘 코르트는 20년에 거쳐 이 책을 완성했지요. 작가들은 괴짜지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창작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개 인 셈이지요. 작가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빛을 보지 못했지만 후세에 영광을 누린 경우가 많습니다. 미하엘 코르트가 지적했듯, 작가 한 명의 이루어 낸 문화적 성과는 현재를 사는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은 작가 몇 명이 개별 산업에 버금가는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고 불러일으키고 있지요. 알렌산드르 푸시킨은 보드카 광고에도 등장할 정도니까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제임스 조이스 작가 한 사람을 우려먹어도 평생 교수생활을 영위 할 수 있으니까요.
“작가 내지는 사상가가 되려는 사람은 현대 시민 사회에서 물질적인 성공에 기초한 가치 척도로 볼 때(최소한 조금은) 미쳤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어제 전철을 기다리다가 벽면에 걸린 글을 읽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영국 귀족 가문에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정치계 입문하고 경제계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 그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흠모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인도로 떠나 성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대표적인 인도어로 소개하기도 했지요. 세월이 지나, 백과사전에는 동생의 이름만 자세히 소개되어있습니다. 형의 이름은 동생의 형이란 것 밖에 소개되어 있을 뿐.
 |
독일어로 된 가장 위대한 찬가들을 쓴 시인 프리드리히 휠덜린은
생애의 36년을 거의 바보 취급 당하며 배고픈 예술가로 지냈다.
작가와 사상가의 천재적 창조행위가 없었다면 우리의 의사소통은 초라해졌을 겁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 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참 어렵지요.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회자되는 대표적인 직업군은 협소하지요. 작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재능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문호로 불리는 발자크는 수도사 옷을 걸진 채 하루 60잔의 커피를 마시면 집필을 했습니다. 매일 열여섯 시간 동안 글을 썼지요. 괴테는 역작 파우스트를 64년 동안 고치고 다듬어 세상에 내 놓았지요. 영주의 상속자 붓다는 자유를 얻기 위해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작가나 사상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가나 사상가가 되고 싶다고? 직업이 아니니까. 그런 일은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단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가되면 밥 나와?
그래 잘 선택했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과연 열에 몇이나 될까요? 광기에 관한 잡학사전을 읽으면서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 참고 및 본문 인용 발췌: 광기에 관한 잡학사전
'삶의 지혜와 감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엄마도 아기도 스트레스 안녕, 자연주의 출산이란? (0) | 2011.03.16 |
|---|---|
| 어떤 졸업 선물이 좋을까? (0) | 2011.02.10 |
| 설탕 없이 살 수 있을까? (0) | 2011.02.09 |
| 그루지야 130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0) | 2011.02.05 |
| 내가 당신의 밥상에 오르지 못한 까닭? (1) | 2011.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