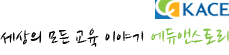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
슬픔이 극에 이르면 아픔이
되고, 아픔이 도를 넘으면 상처로 남는다. 슬픔과 아픔은
인간으로서 숙명처럼 겪어야 할 인생의 과정이라 쳐도 그 슬픔과 아픔이 도를 넘어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된다.
상처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돼 평생 그 아픔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애이불상(哀而不傷)’을 말한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노래한 <시경(詩經)>의
‘관저(關雎)’
장을
평론하면서 ‘슬프지만(哀)
그 슬픔이
상처(傷)로 남지는 않았다’고 했다. 귀한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해 차마 입에 담기도 안타까운
이번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과 그 아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슬픔이 상처로 남지 않기를 기원하며 ‘애이불상(哀而不傷)’의 구절을 가슴에 새겨본다.
참사의 문제점을 논하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리더의 소신과 책임의식 부재에 대해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다. 승객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승무원들은 본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려고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구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책임을 진 리더들은 한시가 급한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소신껏 구조명령을 내리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나중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는 보신주의의 완결판을 모두 보여준 것이다.
지난 번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이 났을 때도 소방방재청이나 문화재청 어느 누구도 기와를
뜯고 진입해 물을 뿌리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밤새 팩스만 주고받았다. 결국 국보 1호 숭례문은 잿더미로 주저앉고 말았다. 내 앞에 닥친 재해가 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고 나의 자리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있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아무리 인사권자의 명령이라도 백성과 나라의 보존에 위배된 명령이라면 거부할 줄 알았다. 자신이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생명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장군으로서 보민(保民)과 보국(保國)의 소명의식을 어김없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였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 보면 장군이 전장에서 진격과
후퇴를 명령하는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진격을 명령함에 칭찬과 명예를 구하고자
하지 마라(進不求名)!
후퇴를
명령함에 문책과 죄를 피하려 하지 마라(退不避罪)!
진격과 후퇴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惟民是保)
그 결과가
조국의 이익에 부합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利合於主).
이렇게 진퇴를
결정하는 장군이 진정 국가의 보배인 것이다(國之寶也).’
국보(國寶)급 리더의 소신과 결정에
대한 <손자병법>의 구절이다. 인사권자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는 하는 사람이라면 리더로 있을 자격이
없다. 나중에 어떤 비난과 책임을 지더라도 현장을 정확히 읽어내고 결정했더라면 슬픔이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슬픔이 상처가 돼서는 안 된다. 비록 자신만 살고자 했고 자신의 자리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슬픔이지만 아픔까지만 허용하고 상처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스펙과
시험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 오로지 자신의 생명과 자리에만 연연하고 정작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직분과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