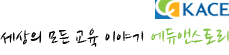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내가 일어 만점 받은 이유, 선생님 그립습니다.”
웃음 넘치는 가정만들기 2010. 8. 9. 15:04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일 때문이었지만, 그저 좋았습니다.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도 진했습니다. ‘이 좋은 선생님들이 더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
고군분투랄까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에 대한 사랑과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무기삼고 위안삼아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가에 잔웃음이 서려있는 것은 늘 그런 아이들 틈에서 지내는 작은 보상일까요.
선생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나니, 저의 선생님들이 그립습니다. ‘아, 난 참 행복한 아이였구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열한 분의 담임선생님 모두(내리 2년 담임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는 저의 고등학교 일어 선생님도 출석하십니다. 지독한 근시라 교탁 바로 앞에 앉은 저는 일어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면 늘 선생님께 꿀밤 한 대 씩 맞았습니다. “일어 못하는 은홍아(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번엔 몇 점 맞았니?” 저는 가끔 당당하게 “11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구, 잘했다.” 꽝! 평균 9점 대였으니, 11점이면 엄청 잘 한 것이지요.
“일어 못하는 은홍아.”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는 게 실지 않았습니다. 내심 좋았습니다. 그 부름에서 선생님의 관심과 애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매와 약각은 시니컬한 미소로 한 카리스마 하셨던 선생님을 교회에서 뵐 때면, ‘이젠 늙으셨구나.‘ 외람되게도 그런 측은지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선생님 죄송합니다”). 졸업하고 10년이 넘어 뜻하지 않게 한 교회에서 다시 뵌 선생님께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 선생님, 그래도 대입 시험에서는 만점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본 정부 정책 자료집 번역해서 첫아이 분유 값도 벌었습니다.”
“일어 못하는 은홍아. ” ...“ 은홍아, 넌 일어 잘 할 수 있어.” 그렇게 들렸나 봅니다.
최근 또 다시 학교와 선생님에 관한 우울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명 받은 선생님들이 구름 같이 일어나 학교와 나라와 세상을 선한 사회로 만들 날이 오리라는 것을.
* 글쓴이 : 김은홍(크리스채너티 투데이 한국판 편집장)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정기 구독도 + ^ ^)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웃음 넘치는 가정만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때 그사진, 학교 가는 길 (1) | 2010.08.11 |
|---|---|
| 가정은 학교다, 가정에 대한 좋은 말 베스트32 (0) | 2010.08.10 |
| 누군들 자장가가 그립지 않으랴 (0) | 2010.08.04 |
| 부는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0) | 2010.08.03 |
| 핀란드 교육은 왜, ‘뜨거운 감자’ 일까? (1) | 2010.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