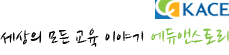태평하지 못했던, 나의 태평농사법
삶의 지혜와 감동 2010. 10. 29. 15:05
무사태평. 얼마나 좋은 말인가!
아뿔싸 태평농업에 혹했던 나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치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고 그저 씨 뿌리고 자연이 주는 만큼만 거두는 태평농법 이야기를 내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십년 쯤 전 어느 신문기사에서였는데, 일단‘멋진’단어에 혹했고 태평하니 더 잘되더라는 꿈같은 철학의 실현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며칠 동안 직장에서 우리도 태평 마인드를 갖자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좀 놀고먹자는 이야기의 변형이었던 것 같다.
그 뒤 조그만 출판사를 차려 몇 권의 생태 환경 책도 내게 된 이유로 열성 생협 조합원인 아내를 따라 귀농운동본부 벽제농장에서 주말농사를 시작했다. 사실 처음부터 그리 태평하지는 못했다. 상추며 오이며 풋고추며 이것저것 따먹는 재미를 단단히 들인 아내가 뻔질나게 나를 끌고 농장에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마음속에 슬슬 불평이 일었다. 도대체 고생스럽기만 하고 기름값도 안 나오는 이런 일을 위해 태평스럽게 지내야할 주말의 하루를 꼬박 바쳐야 하는 것인지.
여하튼 그렇게 일 년을 했는데 주변에 주말농장 한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부부가 뭐 좀 안다고 여겼는지 어떤 지인이 서울 외곽 서오능 근처 자기 땅을 내줄테니 한번 지어보라고 했다. 찾아가보니 한 300여 평 되는데 웬만한 운동장보다 더 넓다. 걱정도 좀 됐지만 욕심도 좀 생겼다. 아는 사람들을 모아 좀 더 크게 지으면 더 적은 노동에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감언이설로 열 가족을 모았으니 그 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했다. 몇 가지 운영방침도 정했는데,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 같은 작물은 네 것 내 것 없이 집단농장식으로 가꿔 공동분배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각자 원하는 만큼 쓰도록 했으며, 그러고도 남는 나머지 땅은 윤작을 핑계로 그냥 방치하기로 했다.

그렇게 뚝딱뚝딱 농장을 만들고 땅을 배분하고 감자를 심고 채소 씨를 뿌리고 고추와 옥수수, 호박 모종을 심었는데, 봄까지는 별다른 무리 없이 착착 진행되었다. 문제는 고구마를 심고 난 후 장마를 끼는 여름부터였다.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삼복더위에 그늘 한 점 없는 밭 한가운데 땀으로 목욕하면서 풀잡는 작업의 어려움을. 꾀가 생긴 몇 가족은 농사를 포기하다시피 했고 그들이 포기한 밭에 무성히 자란 잡초가 얼마나 우거졌는지 허리만큼 자란 풀숲 사이를 걸으면 뙤약볕에도 바지가랑이가 축축해진다. 거기에 더해 산모기 떼들은 대낮에도 맹렬하게 살갗을 물고, 온갖 벌들은 서식지를 침범하는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아이를 둔 가족들은 질색을 하며 점점 오는 횟수가 줄다가 급기야 농사 중단을 선언했다. 덕분에 가을 농사는 서너 가구의 힘으로 겨우겨우 무와 배추 몇 개, 고구마 몇 킬로그램, 늙은 호박 열 덩이 정도의 수확에 만족해야 했다. 결과는 참담했지만 그래도 모두들 자족하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 다음 해에도 규모는 대폭 줄어 서너 가족이 모여서 농장을 가꿨으나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주말농장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전라도 영암에 계셨던 아버지가 병을 얻어 서울로 오셔서 요양해야만 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남은 빈 집과 딸린 300여 평의 밭이 문제였다.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공시지가의 20퍼센트나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네에 살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니 공시지가보다도 한참 낮은 가격에 팔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이다.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을 그렇게 처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마음먹고 귀농하자니 다 자란 후로는 서울에만 살았던 나로서는 마음의 준비도, 땅도 턱없이 부족했다.
여러 생각을 하다가 태평농법에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꽂아두면 끝’이라는 고구마로 승부를 걸었다. 옆집에 물어보니 아무리 못 지어도 평당 5킬로그램은 나온단다. 고구마 5킬로그램 한 상자에 만 원만 잡아도 300평 곱하기 1만 원이면 300만 원이다! 어차피 일 년에 몇 번은 가야할 곳이니 여비를 빼고도 상당히 남을 것 같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어차피 나의 태평농사법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같이 3단계. 모종 심고, 풀 뽑고, 가을에는 수확이다!
그 후? 5월에 모종 심는 데만 꼬박 일주일 걸렸다. 요즘 인기가 좋다고 해서 호박고구마를 비닐 멀칭하고 심었는데 모종만 1천500포기 들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문제가 생겼다. 모종이 비실비실 말라죽는 것이다. 원래 호박고구마는 약해서 모종 후 비닐멀칭을 하고 그 속에 일주일 정도 두었다가 잎을 꺼내줘야, 비닐 안 머금은 습기로 뿌리가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때늦게 이웃들에게 들었지만, 본업이 이미 일주일이나 중단됐는데 더 머물 수는 없었다. 고구마의 생명력만 믿고 잘 자라겠지 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6월에 내려와 보니 심어둔 모종의 태반은 사라진 것 같다. 다시 심는 방법도 있다지만 그러려면 또 그만큼 머물러야 하니 포기하고 대충 김매기만 해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문제는 장마였다. 작년에는 장마가 유독 끊기질 않아, 빗길을 뚫고 내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7월은 그냥 보내고 다들 휴가를 떠나는 시기에 내려갔는데, 밭은 눈을 의심해야 하는 지경이었다. 얼룩말이 나타나도 어색하지 않을 사바나 초원이랄까, 풀이 거의 밀림처럼 그득했고 뒷집 닭들이 무슨 먹을게 많은지 익숙하게 드나들고 있었다.
한 1시간쯤 풀을 뽑았나 했는데 한 5미터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한다. 이제 오기가 생겨서 서울의 생업은 아예 잊어버리고 풀을 잡기로 해. 또 일주일을 골만 탔다. 그래도 그렇게 하니 나의 꿈을 담은 고구마 줄기들이 하나둘씩 보인다. 잎사귀가 노래서 포기했는데 끈질기게 살아난 놈들도 간혹 보인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한 마디 한다.“오매 고구마가 징글징글하게 산당께. 그래도 연적 살아있오잉”
가을에 수확하러 갔다. 풀은 제풀에 그야말로 풀이 죽어서 누렇게 뜨고, 아직 파릇한 것은 고구마 줄기와 잎이다. 그래도 살아남은 고구마 줄기가 보인다. 남들은 절반은 버릴 각오하고 트랙터로 캔다는데 고구마 하나하나가 아쉬운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삼지창 들고 죽을둥 살둥 쑤셔댔다.
다 캐니 서른상자가 나왔다. 10평에 한 상자. 아까워서 팔 마음이 저리 사라지고 말았다. 10만원 준다해도 안 팔 우리의 금(?)고구마를 아예 그냥 나눠주기로 했다. 친척들과 지인들한테 나눠줬더니, 왜 그런 짓을 사서 하냐면서 걱정하던 사람들이 좋아라하며 웃는다.
봄이 오면 나는 고구마 소동은 올해도 벌일 것이고, 도시 근교에서는 많은 주말농장 가족들이 서투르게 씨를 뿌리며 웃을 것이다.
태평은 정녕 어려우니 부디 기쁨을 얻는 이상은 바라지 말길.
텃밭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만의 에덴동산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심고 충실한 수확을 거두어들인다.
에이머스 브론슨 올코트
자신의 작은 땅덩어리에서 곡괭이질을 하고,
씨앗을 심어 소생하는 생명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기쁨이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다.
찰스 더들리 워너, 밭에서 보내는 나의 여름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정기 구독도 + ^ ^)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감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대성 사망으로 본, 오토바이 사고 현주소 (0) | 2010.11.01 |
|---|---|
| 몰디브 유투브파문, 대통령까지 사과한 이유? (0) | 2010.10.31 |
| 팬더의 똥으로 만든 카드이야기? (0) | 2010.10.27 |
| 가을 한파를 녹이는 긍정적인 밥을 생각하며 (1) | 2010.10.26 |
| 시간강사폐지, 한 시간강사의 유서를 떠올리며 (2) | 2010.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