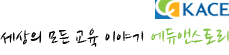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한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는 벅찬 느낌은?"
삶의 지혜와 감동 2010. 6. 20. 10:44

누구도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을 보지 못한다. 280일 몸 안에서 키워온 아기를 세상으로 인도하는 엄마도 정작 그 아기가 세상의 빛을 맞이하는 순간을 보지 못한다. 아기를 밀어내는 고통을 지켜보는 아기의 아빠와 의사, 간호사만이 그 순간을 지켜볼 뿐이다. 여기에 한 사람 더, 인간의 시작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기다려온 사진가 남경숙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8년 간 산부인과에서 아기엄마의 허락을 얻어 탄생의 순간을 찍어왔다.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며 귀한 순간이라 사진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누구도 꺼려한다. 하지만 귀한 인간의 시작을 카메라에 귀하게 담고 싶어 그 작업을 했고, 그 사진들을 모아 <36도5부>라는 제목으로 사진집(다빈치, 2008년)을 펴냈다. 이어 지난 4월에 경남 김해와 서울 인사동에서 두 차례 전시회를 열었다.
“시작이 귀하면, 사는 것도 귀하고 끝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시작을 보아온 그는 아기의 탄생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삶에서 귀한 순간을 맞은 것이다. 비록 탄생의 현장은 고통과 비명과 자지러대며 울어대는 아기의 울음소리로 가득하지만, “태어나 살다가는 우리네 인생에서 인간으로서 자존감과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고통이 바로 희망이고 희망의 온도가 ‘36도5부’이다. ‘36도5부’는 365일을 36.5도로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36도5부>사진들은 흑백이다. 다큐멘터리 사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검고 흰 공간만이 사진을 설명한다. 이 사진들이 생생한 현장의 색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어떨까.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흑백사진 속의 아기 모습에도 고개를 돌린다. 자신의 경험이 되살아나서일까. 태지와 핏물로 범벅이 된 아기의 모습에 놀라워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삶은 너무나 솔직하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단호하게 시작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기엄마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미혼이다. 지금은 김해에서 치과 마취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로서 1년 간 산부인과에 근무하며 많은 아기와 아기엄마들을 보며 그 고통을 밖에서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아기를 낳는 여자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벅찬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아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 카메라에 그 장면을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왜 이것을 찍는지 갈등도 있었고 산모의 허락을 얻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어낸 표정도 장면도 아닌,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장면을 담는 데 매력이 있었고 한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는 벅찬 느낌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다.
그가 찍은 첫 사진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잠든 아기의 얼굴이다. 2007년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자신의 두 손을 포개어 한쪽 얼굴에 대고 누워 잠자면서 살짝 웃음을 띤 아기의 모습은 저절로 그 미소가 전해진다. 하지만 그 후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보다는 현장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아낸다. 예쁜 모습보다는 탄생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산통은 신이 내린 고통이라고 한다. 그 고통을 희망으로 보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고통이 가지고 오는 평화로움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젊은 여성들에게 <36도5부>전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시청이나 구청 로비도 좋고 공원도 좋단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탄생의 순간을 보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함께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다.
책을 펴내고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연거푸 해댔다. “내가 뭐할라고 이러나”싶었단다. 하지만 사진전에 찾아온 많은 어머니들이 “고생했다, 어떻게 이걸 찍을 생각했나, 대단하다”라는 격려의 말을 듣는 순간, 축 내려간 어깨에 힘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작가노트를 통해 탄생 현장의 주인공인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처연한 고통과 희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탄생의 경이로움을 몸소 실천한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어머니들의 값진 희생과 끝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아기를 품고 있다 세상에 내놓는 일은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쩌면 삼신할미의 점지에서 시작된 삶의 축복이 아닐까요.
280일간 품고 있던 아기를 세상에 내보내려 합니다. 산통은 하늘이 내려준 고통이라고 합니다. 품 안의 생명을 품 밖에서 맞기까지 산모는 어쩔 도리 없이 허리와 배로 이어지는 아픔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몸 안에서 뭔가 ‘쑤~욱’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 순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살았다, 해냈다, 끝났다!”

엄마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안도감에 젖어있을 뿐 아기의 세상맞이 풍경은 보지 못합니다.
한 아기가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강렬한 빛이 낯설기만 합니다. 눈을 꽉 감아봅니다. 주먹을 쥐고 다리를 바짝 오므립니다. 하지만 불쑥 다가선 세상이 궁금해 엄마 몸에서 몸을 막 빼낸 아기는 눈을 뜨고 두리번거립니다.

엄마와 아기 사이를 이어준 탯줄이 끊기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울어라, 네가 이 순간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열심히 우는 일이다.”
철썩철썩 엉덩이를 때리는 의사의 손길은 맵기만 합니다. 아기의 울음은 엄마와 출산 도우미에게 위안을 주는 신호입니다.
“살았구나, 드디어 세상에 나왔구나” 하는 안도감 말입니다.

자지러지게 울어 제치던 아기는 엄마 배 위에 귀를 붙이는 순간 울음을 그칩니다. 36도5부의 평화의 온도를 느끼나 봅니다. 아기와 엄마는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서로 독립합니다. 하지만 280일간의 오고간 정은 엄마와 아기의 가슴이 맞닿으며 다시 이어집니다.
아기의 얼굴을 처음 본 엄마는 채 닦이지 않은 핏자국과 쪼글쪼글한 살갗을 보며 놀라워하는 눈치입니다.
“요것이 그리도 애를 쓰며 내놓은 나의 아이란 말이야?”
몇 분 전의 고통이 서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낸 일이 참으로 대견합니다.

세상에 얼굴을 막 내민 아기의 모습은 쪼글쪼글하고 울긋불긋한 피부에 마냥 울어대기만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단장을 끝낸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탄생의 노동을 끝낸 아기는 쉬고싶어하는 듯 하품을 해댑니다.
“아기야, 수고했다.”
세상을 맞이한 아기는 첫 느낌이 좋았나 봅니다. 재미난 꿈까지 꾸며 웃음을 지어봅니다. 이마에 쪼글쪼글 주름을 만들며 울어 제치던 그 모습은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아기는 이 세상이 마음에 드나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알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냥 편안한 이 순간만 기억하고 싶을 겁니다.
이제 엄마와 아기를 이어주는 생명줄은 아기 손목에 찬 팔찌로 이어졌습니다. 누구의 아기라는 이름이 적힌 팔찌를 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숙제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지없이 편안한 시간. 하지만 이 순간조차 고통 후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희망의 씨앗인가 봅니다.
* 사진: 남경숙/글: 우미숙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감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풀뿌리 아프리카 축구 기록 '아멘 프로젝트' (2) | 2010.06.21 |
|---|---|
| 존 우든의 성공과 실패,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0) | 2010.06.21 |
| 탓닉한의 플럼빌리지에서 만난 행복과 평화 (0) | 2010.06.19 |
| 나무를 심는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0) | 2010.06.16 |
| 선생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더라? (0) | 201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