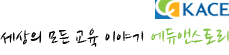눈썹달이 된 아내
미디어 속 교육이야기 2014. 4. 11. 09:46
깊은 잠에 빠진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하늘엔 눈썹달이 혼자 걸어가고
술 취한 내 그림자도 흔들흔들 걸어갔다.
외등의 불빛들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그림자들도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다.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 창가에 피어 있는 꽃을
나누어 보려고 불을 켜 놓아 그 주변이 환했다.
거기에 서 있던 꽃나무가 하얀 바람처럼
그림자 앞으로 다가왔다.
고귀한 여인 같은 흰 목련이었다.
감탄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썹달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다보며 말하는 듯했다.
“남자들이란, 늙으나 젊으나 하얀 손이 따라주는 술잔에는
마음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더라.
우아하고 풍만한 목련을 보면서도,
저렇게 가슴을 설레고 있지 뭐야.”
그 순간 나는 정수리 밖으로 술의 취기가 다 빠져나가는 듯했다.
나도 카페여인이 따라주는 술잔에 취하고 말지 않았던가.
다시 걷기시작 했다. 그림자들은 앞장을 서기도 하고,
옆에 붙어 따라 걷기도 했다.
내 몸은 하나인데 그림자는 둘이 되기도 하고 셋이 되기도 했다.
그 생김새도 구구각각이었다.
나는 놈들을 환히 보는데 놈들은 나를 볼 수 없을 터였다.
그런데도 내가 발을 들어 걷어찼더니,
녀석들도 일제히 발을 들어 걷어찼다.
눈이 없는 저희들이나 나나 허공을 찬 것은 마찬가지였다.
내가 거수경례를 했더니 녀석들도 똑같이 따라했다.
내가 춤을 췄더니 놈들도 일제히 손발을 놀려 춤을 추었다,
‘햐! 이놈 봐라아’ 앞서가는 키가 제일 큰놈을
아파트 벽면에 밀어붙여 보았다.
그런데 놈은 유연하게도 허리를 뒤로 꺾고 또 꺾어서는
머리를 내 코앞에 바싹 들이미는 것이 아닌가.
재미있었다.
내 몸 하나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보기는 처음이어서였다.
나는 그림자들 발자국을 길바닥에 흘려 놓으면서 집으로 갔다.
집안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나의 실체는 비로소 그림자로부터 일부분이 되살아났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담긴 그릇들이 뚜껑에 덮여 있고,
벽면에 걸려 있는 칠판에는
‘밥은 보온밥통에…’라는 글자가 마구 휘갈겨 씌어 있었다.
거실바닥 매트위에는 아내가 혼자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은 눈썹달 같았다.
오랜 동안 앓아온 심장병으로 반듯하게 눕지 못하는 아내,
다시는 보름달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믐달이었다.
| 출처 : 한준수 수필집 '눈썹달이 된 아내' 中에서 | 달은 이울다가도 다시 차오르지만 조금씩 가늘어지는 우리네 인생, 몸도 마음도 왜 자꾸 약해지고 버거워질까요? 그래도 슬프지만은 않은건...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았다는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를 내 아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 속 교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엄마 파는 가게 있나요? (0) | 2014.05.08 |
|---|---|
| 김 대리, 오늘부터 사회공헌팀이야 (0) | 2014.04.21 |
|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0) | 2014.03.07 |
| 어바웃 타임, 어바웃 라이프 (0) | 2014.02.26 |
| 도끼 (0) | 201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