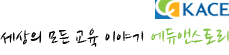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이 곳에서는 성행위를 할 수 없음’
볕 좋은 4월의 어느 날,
중랑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특강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나는 깜짝 놀랐다.
굴다리 옆 회색 담벼락에다 누군가
붉은 색 글씨로 그렇게 써 놓았던 것이다.
커다란 가위 그림까지 곁들여서 말이다.
잠시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누가 이런 데서 성행위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니
‘성행위’가 아니라 ‘상행위’였던 것을
누가 바깥 점을 지우고 대신 안쪽에다 점을 찍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행위가 성행위로 바뀌고
점 하나에 뜻이 아주 이상야릇하게 변질되고 만 것이다.
그렇겠지, 하면서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흔히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물을 보고 표현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따위 짓을 했을까?
만일 젊은 여자들과 학생들이 본다면 얼굴 붉힐 일이며
남자들도 그 글을 읽고 컴컴한 굴다리를 통과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상에 젖게 되거나
또한 음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었다.
글쎄, 내가 너무 비약했나?
아무튼 한시 바삐 본래대로 고쳐 놓아야 할 것이다.
또 한번은 양평대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경험했던 일이다.
모처럼 친구들과 용문산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당시 양평에서 팔당 쪽으로 넘어오는 왕복 2차선 길은 만성정체구역인지라
그 날도 우리는 차가 막힐 거라는 생각에 용문사 절은 구경도 못한 채
근처 식당에서 점심만 먹고는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그런 노력도 헛수고였다.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은 양수리 근처에서부터
꼼짝을 못하고 긴 행렬을 이루었으니...
나는 거의 체념한 상태로 일찍 가긴 다 글렀구나.
설마 오늘 안으로야 들어가겠지 하는 느긋한 심정으로
차창 밖을 두리번거리는데 범상치 않은 글이 내 눈에 들어왔다.
공사 중인 시멘트 다리 맨 꼭대기에 ‘혼이 담긴 시’라고 내용이 낯설긴 했으나
글씨만큼은 아주 또렷한, 이상한 표어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밑에는 조금 작은 글씨로 ‘시공사 흥화 건설’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니 문예회관 공사도 아니고 다리 만드는데
무슨 놈의 혼이 담긴 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다리 공사와 시(詩)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함께 타고 있던 세 명의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들 역시 이상하다는 반응뿐이었다.
답답했다.
당장 내려 현장 소장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도대체 공사 현장에 혼이 담긴 시가 왜 끼어들게 되었을까?
공사 책임자의 특별한 철학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시를 읊는 마음으로 평화와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뜻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고 집에 와서도 그 의문은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로부터 서너 달 후,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시인
최하림 선생 댁을 다녀오면서 그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렸다.
그것은 ‘혼이 담긴 시’가 아니라 ‘영혼이 담긴 시공’이었는데
‘영’자와 ‘공’자가 떨어져 나가서 그리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뜻이 통하는 제대로 된 글귀를 보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만약 이날도 ‘혼이 담긴 시’가 그대로 붙어있었다면
나는 또 여러 날 머리 나쁜 나를 스스로 들볶았을 테고
급기야 건설회사에 전화로라도 문의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걱정도 팔자란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칠 일이지 괜한 일에 신경을 곤두세운다나.
그러나 어쩌랴,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길을 가다보면
맞춤법 틀린 간판은 왜 그리 많은지...
언젠가 식구들과 양평 해장국집을 갔다.
메뉴판을 뒤적이다가
‘24시간 정성 드려 고아 만든 새로운 보양식 출시’라는
글을 보는 순간 나는 또 직업병(?)이 발동하고 말았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인을 불러
‘정성 드려’가 아니라 ‘정성 들여’가 맞는 말이니 다시 쓸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혹시 언짢아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싹싹한 여주인은 당장 고치겠다며 오히려 고마워했다.
어디 그뿐인가.
노래방에 ‘래’자가 떨어져나가
‘노-방‘이 된 것처럼 글자 한 자씩 떨어져나간 간판도 자주 보인다.
따라서 거리에는 글씨 공사를 해야 할 곳이 참 많은 것 같다.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한다는데
그래서인지 최근의 간판들은 예전에 비해 글씨가 작고
색깔이나 디자인에서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섬마을 밀밭집’(해물 칼국수집) ‘첫날밤 분홍 이불’(이불집)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안경집) ‘오, 나그네여 쉬어 가게나’(전통찻집).
이런 감성적인 간판을 달고 있는 상점들은 왠지
호감이 가고 한번쯤 들러보고 싶은 곳이다.
일찍이 언어는 ‘사상의 옷’ ‘존재의 숲’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가뜩이나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생각 없이 함부로 쓰는 말과 글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이 사회가 더 정신없고 혼탁해진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함수연| 만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감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요? (0) | 2013.11.14 |
|---|---|
| 광화문 연가 (0) | 2013.10.14 |
| 국수여행 (0) | 2013.07.23 |
| 아, 어머니 (0) | 2013.06.24 |
|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0) | 201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