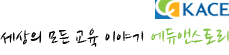영감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요?
|함수연| 만남 2013. 11. 14. 18:56
마흔 살에 문단에 데뷔한 소설가 박완서는 여든에 숨을 거두기까지 쉼 없이 글을 썼다. 그가 77세에 펴낸 <친절한 복희씨>는 노년층 풍속을 세밀하게 그려내 우리나라 실버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나온 그의 유고집 <노란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해 전 세상을 뜬 작가가 생전에 살았던 경기도 구리의 집은 아치울 노란 집으로 불렸다. 2000년대 초반 그 집에서 쓴 미발표 소설과 산문을 박완서 씨의 딸이 엮어서 만든 책 제목이 바로 <노란 집>이다.
총 여섯 마당으로 나누어진 글 중에서 첫 장 ‘그들만의 사랑법’은 짧은 소설 형식으로 주로 영감님과 마나님으로 표현되는 노부부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어쩌면 누추해 보일 수도 있는 노인의 삶을 때로는 쾌활하게 때로는 슬픔과 유머가 적당히 가미된 매우 오묘한 풍경을 보여주어 참 재미있게 읽었다. ‘속삭임’ ‘토라짐’ ‘동부인’ ‘나의 보배덩어리 시절’ ‘휘모리장단’ 등과 같이 우선 글 제목이 정겹고 친근했다.
‘토라짐’에서는 앙상한 뼈다귀로 남은 굴비 삽화가 등장한다. 점심상에 알배기 굴비를 올릴 때까지만 해도 마나님은 행복감으로 마음이 그들먹했다. 남편과 겸상을 해서 막 수저를 들려는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런데 잠깐의 전화를 받고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가져온, 한 마리에 오만 원도 넘는 영광굴비가 뼈만 남은 채 사라져버린 것이다. 영감님이 어찌나 알뜰하게 발라 먹었는지, 머리와 꼬리를 잇는 등뼈의 가시가 빗으로 써먹어도 좋을 정도다.
앗, 마나님의 경악! “영감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요?” 말하고 싶지만 평생 제 입 밖에 모르는 영감과 살아왔거늘 새삼 웬 지옥 불같은 증오란 말인가? 하긴 저 영감이 무슨 잘못이람. 아들을 저따위로 키운 시어머니 탓을 하다가 난 또 뭔가. 내가 저 영감을 저렇게 길들인 걸. 자신을 다독거려도 보지만 그래봤댔자 남는 건 허망함밖에 없다. 한바탕 허망감이 휩쓸고 지나가니 다시는 열리지 않을 빗장처럼 마음이 무겁게 닫힌다. 그러나 영감님은 마나님이 왜 토라졌는지도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순박한 우리네 남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듯 작가는 노년기 부부에 대한 넉살과 익살, 소시민적 행복의 허위의식을 은근슬쩍 꼬집는다. 읽다보면 우리 세대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랄까, 누더기 옷에서 이 잡던 때를 그리워하는 궁상스러운 소리를 해대도 “그럼, 그렇고말고!” 하며 저절로 맞장구를 치게 된다.
우리는 늦도록 해로하는 부부를 보면 서로 등 긁어줄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고 부러워들 한다. 소설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온다. 손자들한테 선물 받은 효자손이 집안 여기저기 굴러다니건만 영감님은 한사코 마누라 손만 찾는다. 차가운 효자손 대신 적당한 체온으로, 적당한 거칠음으로, 가려운 곳을 적당히 알아서 긁어주는 마누라 손은 영감님의 유일한 사치다. 마치 손길을 타는 어린애 같다. 이제 영감님의 등은 청년의 등도 아니고 장년의 등도 아니다. 삭정이처럼 쇠퇴해가는 노년의 몸이지만 마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온몸에 생기가 돋고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
하지만 마나님은 그 반대다. 한때 그녀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든 떡판처럼 든든하고 기름진 등판은 어디가고 영감님 등을 긁어주면 어쩔 수 없이 만져지는 굽은 등뼈 마디도 섬뜩하거니와 치마폭 하나 가득 떨어지는 허연 비듬과 늙은이의 강한 체취가 불러일으키는 혐오스러운 이물감 때문이다. 이러면 죄 받지 싶은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혔다가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정직한 내면의 소리 같기도 하다.
문학작품 속에서만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기 삶에 대해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 되고 있다. 과거 노인하면 나이가 든 늙은 사람을 말했다. 나이로는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칭한다. 그러나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노인의 정의를 달리한다. 자신을 늙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낄 때라고 한다. ‘이 나이에 그깟 일은 뭐해.’라고 생각하거나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젊은이들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현재보다는 좋았던 과거 시절을 그리워할 때 노인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요즘 노인은 예전의 노인이 아니다. 91세의 할아버지와 74세의 할머니가 식스팩을 자랑하며 세계 최고령 보디빌더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세상이다. 그런가하면 올해 타계한 일본의 백한 살 할머니 시인의 스토리도 주목을 끈다. 아흔아홉에 낸 첫 시집 <약해지지 마>가 150만부나 팔리면서 실버 세대 창작 붐을 일으켰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환갑 넘은 신인 작가와 시인들이 줄줄이 등단하고 있다. 우리 신춘문예에서도 50.60대 당선자가 낯설지 않다.
노인 문제 전문가들은 이제 은퇴 후 8만 시간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8만 시간은 60세 은퇴자가 80세까지 20년간 수면, 식사 등을 빼고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사실 요즘 은퇴자들은 100세까지 살 각오(?)를 해야 하니 20년을 더한다면 무려 16만 시간이 큰 강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과연 나도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을까...
최근 서울시가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단다. 노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첫 조치라고 한다. 명칭 하나로 대접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인 보다 어르신 하면 왠지 지혜와 연륜을 가진 어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좋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주인공인 늙은 어부를 이렇게 묘사했다. ‘머리가 허옇고 수척하지만 두 눈만큼은 바다 빛깔이고 쾌활함과 불굴의 의지로 불탄다.’ 머리카락은 은빛이지만 마음과 눈빛은 언제나 청춘인 어르신들,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