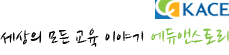공휴일인데도 식구들이 다 나가고
혼자 있게 되니 무료했다.
남편은 새벽같이 강원도 홍천으로 놀러갔고
딸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따라서 더 이상 나갈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 이 시간.
늦잠이나 잘 요량으로
다시 침대 속으로 향하는데
때마침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언니! 나야, 다행히 집에 있었네.
나, 다음달 12일 한국에 다니러 갈 거야.”
“그래? 잘 됐다.”
싱가포르에 사는 여동생의 전화였다.
곧 여름 방학을 맞는 두 아들과 함께 와서
시어머니가 계시는 수원에 머무를 것이며,
이번에 와서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선물은 무얼 사가면 좋겠냐는 등
꽤 긴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는 사이 밀려오던 잠은
멀리 달아나 버렸다.
아무리 무료해도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할 필요까지는 없는 터라
찌뿌둥한 몸을 집안 일로 풀기로 하고 청소와 빨래부터 해치웠다.
아이들 방에 이불과 침대보까지
다 벗겨내서 세탁기를 두 번이나 돌렸다.
혹시 동생네 식구가
며칠 자고 갈지도 모르니까
침구 정리는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곤 쇠고기를 듬뿍 넣어 끓인 떡국으로
혼자만의 아침상을 차렸다.
반찬은 배추김치와 동치미가 전부였지만
부유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더욱 향기로웠다.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여유롭고 격조 높은(?)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불현듯 누군가에게 편지가 쓰고 싶어졌다.
‘그래, 어머님한테 편지를 쓰자.’
제주도에 사시는 어머님은 이사한 우리 집에 처음 오셔서
무엇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4박 5일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다가 가셨다.
팔순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호기심에다
말씀도 재미나게 잘 하셔서 늘 이야기보따리가 풍성했던 분이신데,
끼니때가 되면 차려놓은 밥만 말없이 드실 뿐 도통 말이 없으셨다.
‘내가 뭘 잘못 했나?’ ‘이사 와서 새롭게 장만한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거슬려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수업해 가면서
혼자 이삿짐 꾸리느라 동분서주했건만 애썼다는 칭찬 한마디 없이
입 꽉 다물고 계신 어머니가 야속했다.
대화가 끊긴 채 한집에서 며칠을 지내자니
마치 사포 같은 것에 긁힌 듯 마음이 쓰라렸다.
시동생과 어머님이 제주도로 가시고 난 후
곧 바로 편지를 썼다.
이사하게 된 배경과 자금내역을 상세히 썼고
아울러 어머님이 무엇 때문에 그리 언짢으셨는지,
그간 불편했던 내 마음을 글로 정리해서 부쳤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주고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말로 하면 감정이 실려 차분한 대화가 힘들 것 같아
문자언어로 대신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판단일 뿐,
이번에는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닌
편지를 받고 난 후의 어머님 반응이 염려스러웠다.
2주 후, 검정색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지 세 장 분량의 긴 답장이 제주에서 날아왔다.
거기에는 어머님이 오해하셨던 부분도 들어 있었고
당신의 지난날의 아픈 회상도 담겨 있었다.
없는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 와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도 처음으로 하셨다.
그리고 사연 끝에다 그 동안 서로 앙금처럼 남아 있었던
섭섭한 마음일랑 다 잊자는 당부의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도 몇 번이나 덧붙이셨다.
코끝이 찡했다. 역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말보다 글의 힘이 컸다.
만일 마주보고 이야길 했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그토록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살다보면 이렇게 꼬이고 꼬인 매듭 같은 시간을 건너야 하는 일도 있는 법,
결국 그때의 일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돼 이름다운 이해로 끝났다.
사실 내 편지를 받고 어머님이 더 노여워하지는 않으실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답장까지 보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경험도 작용했던 것 같다.
생전 처음 받아본 어머님의 편지글.
황해도 해주에서 여고를 졸업하신 어머님의 글 솜씨는 훌륭했고 감동적이었다.
남편 말대로 글공부를 계속하셨다면 아마 박완서 못지않은 작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답장을 받고 나서 이젠 어머님께 가끔씩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전화보다는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 그런 편지를.
인터넷이 일반화 된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글을 쓰고 읽지만
글을 써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속도감이 없어서인지 편지 쓰기는 점점 실종되어 가는 느낌이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TV 요리 시간에 소개된 ‘해물완자 전골‘을
만들기 위해 장보기를 했다.
보기에 재료와 요리법이 간단하면서도 푸짐해 보였다.
음식을 만들면서 언뜻언뜻 부엌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 구경도 하고
김치 볶음밥도 만들어 먹었다.
저녁엔 삶은 고구마로 식사를 대신하고
좀처럼 진도가 안 나가는 책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를 집어 들었다.
역시 더디다.
베란다 화단 옆 의자에 앉아 책을 건성으로 읽다가 장미꽃과 눈이 마주쳤다.
장미꽃에게 착하다는 눈인사를 해주었다.
게으름 피지 않고 주어진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 말이다.
예쁜 꽃, 착한 꽃.
그런데 없는 솜씨 부려가며 만든 해물전골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왜 여태 소식이 없을까?
아무도 없는 텅 빈집에서 세끼 밥 다 찾아 먹고
빨래와 청소하고, 전화 받고, 편지 쓰고, 인터넷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길고도 풍요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