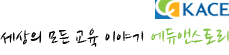장마철에는 부침개를
|함수연| 만남 2012. 7. 16. 16:35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여름날
괜히 입이 궁금해지면
나는 고소한 기름내가 코끝을 자극하고
지글거리는 소리가 빗소리 같기도 한
부침개가 먹고 싶어진다.
밥 외에는 달리 먹을 것이 없었던
내 어릴 적에 부추나 호박 또는 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돼지비계를 두른 번철에다
노릇노릇 알맞게 지져낸 부침개는
장마철 주전부리로는 단연 으뜸이었다.
맛도 맛이지만 아마도 일곱 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올망졸망 둘러앉아 부치기가 무섭게 쟁탈전을 벌려야 했기에
더욱 입맛을 다셨는지도 모른다.
거기에 비하면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몸에 좋다는
각종 야채와 해물, 버섯 따위를 듬뿍 넣고
기름도 콜레스테롤이 적다는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를 가지고
부쳐내지만 아무래도 고소한 맛은 옛날보다 덜 한 것 같다.
그런데 결코 특별한 음식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 부침개에도 우리 집에서는 한 가지 불문율이 있었으니
부침개 첫 장은 꼭 남자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소당을 여자가 먼저 먹어버리면
부정이 탄다나 어쩐다나... ㅡ,.ㅡ
아버지나 큰오빠는 그렇다고 쳐도
새까맣게 어린 남동생이 어머니나 누나들을 제치고
제일 먼저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갔다.
그래서 그 부당함에 맞서
언니들과 함께 저항(?)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내가 지금 어머니 방식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쁘다는데 굳이 역행할 필요는 없지 뭐.’ 하면서 말이다.
이래서 교육이 무섭다고 했나?
뉴스를 보니 올 장마는 예년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란다.
따라서 이번 여름엔 부침개를, 특히 감자전을 많이 부쳐 먹게 될 것이다.
올해는 다른 밭작물보다 감자 농사가 풍작을 이뤘으니
재료에서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먹는 기쁨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클 것 같다.
비오는 날 부침개의 기억이 진한 까닭을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평소엔 상승기류와 함께 날아갈 냄새들이
궂은 날 저기압에 갇혀 주위를 맴돌기 때문에
부침개 지지는 냄새가 유난히 고소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체온이 떨어져 차고 물기 많은 음식을 멀리하게 되는 장마철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식욕을 자극하고 제철 채소를 듬뿍 섭취할 수 있는 부침개가 제격이란다.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 먹는 빈대떡은
원래 가난한 사람의 떡(貧者떡)이라는 뜻이었다.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 유랑민이 남대문으로 모여 들었는데,
이 잘사는 양반집에서 빈자떡을 소달구지에 싣고 와
“누구누구 집의 적선이요!” 하면서 던져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던
‘빈대떡 신사’ 노래 가사처럼 그 시절 가난한 어머니들이
무더운 여름날에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들을 집어넣고
부침개를 즐겨 해먹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옛날에는 무엇이든지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 군소리 없이 먹었다.
지금처럼 “뭐 먹고 싶니?” 물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대령하는 일은 가당치도 않았다.
적어도 음식에 관한 한 어린아이들에게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먹이는 일이 결코 수월치 않다고 말한다.
대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몸에 해롭고, 몸에 좋은 음식은 아이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사실 혀끝에 남아있는 감미롭고 화려한 미각만이 기억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진수성찬의 기억은 강렬하고 매혹적이지만 대체로 살뜰한 여운이 없다.
이에 비해 궁핍했던 어린 시절 음식의 기억은 흐릿하면서도 끈질기다.
그래서 비오는 날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맛엔 어김없이
옛 기억도 조건 반사처럼 끼어드는데 거기에는
우리네 맛의 뿌리인 모성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득 그 옛날 장마 진 날 대청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적시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형제들과
호박 부침개를 나누어 먹던 어린 시절이 그림처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