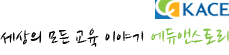한 여름밤의 옥상파티
|함수연| 만남 2012. 8. 1. 10:59
장맛비가 잦아들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다.
그래서 더위를 잠시나마 식히고자
우리 집 옥상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친정식구들과의 저녁 모임이었다.
옥상 파티의 기본 메뉴는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텃밭에서 금방 따온
상추와 풋고추를 곁들였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이 조촐한 야외 식탁을 중심으로
파라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모여 앉으니
어디 여행이라도 온 기분이었다.
손바닥만 한 텃밭과 물탱크 하나밖에 없는
콘크리트 옥상이지만
밤의 옥상은 낮처럼 덥고 짜증나고
꽉 막힌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비록 빼어난 야경은 없더라도
답답한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별을 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거기에다 작게나마 흙냄새까지 맡을 수 있으니
이날 형제들과의 저녁식사는
여느 호텔 만찬이 부럽지 않았다.
도시에 살면서 늘 전원생활을 꿈꾸던 우리 부부는
차선책으로 4년 전에 지금의 옥상 텃밭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야외용 식탁과 파라솔, 고기 굽는 화로 등을 갖추고
종종 지인들을 불러들여 오늘처럼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릴 때도 있었다.
작년 여름 복날에는 옥상에서 반상회를 연 다음,
뒤풀이 행사로 삼계탕과 오리구이 파티를 했다.
공동주택에 딸린 옥상은 우리 집만의 단독 공간이 아니기에
이웃들의 양해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마련한 것들을
아파트 공동 시설물로 쓰도록 했고
채소가 필요하거든 언제라도 좋으니 맘껏 따다 먹으라는 부탁(?)도 해두었다.
옥상의 작은 땅은 하늘이 지붕이다.
바람과 햇빛과 비, 그리고 넉넉지 못한 흙을 덮고도 채소들은 잘 컸다.
고추와 상추, 깻잎, 가지, 뭐든지 심기만 하면 무럭무럭 자라니
아무래도 흙 속에는 삶을 부축해주는 지팡이 같은 힘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화로 위에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요란했다.
아울러 형제들이 부딪치는 술잔의 속도도 점점 빨라졌다.
큰오빠가 한마디 했다.
“야, 이름난 갈비 집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겠는 걸!”
정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마시는 술은 쉽게 취하지 않았다.
또 취한들 어떠랴, 집이라서 문제될 게 없었다.
운전이 걱정이라면 다음 날이 공휴일이니 자고 가면 된다.
모두들 식당도 집도 아닌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했다.
나중에는 양주 한 병을 더 가져 왔다.
은박지에 싸서 고구마도 구웠다.
술자리는 점점 더 깊어졌고 형제들의 비눗방울 같은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우리가 자랄 때는 한집에서 두세 살 터울의 칠 남매가 복작거리니
동기간의 살가운 정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형제가 너무 많아 사랑은커녕 서로가 손해 본다는 느낌이었다.
특히 나는 집에서는 오빠 둘, 언니 둘, 동생 둘 사이에서 특징 없는 칠 남매의 중간이었고,
학교에서는 특별히 잘하는 과목도 못하는 과목도 없는 존재 희박한 그런 학생이었다.
어린 시절 서로 부대끼며 컸던 여러 형제들이 중간에 잘못된 일 없이
다들 건강하게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지근거리에 살면서 함께 나이 먹어가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으랴.
세월의 집요함을 함께 견뎌온 이들끼리의 동질감이랄까,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시간이
요즘 와서는 더욱 애틋하고 소중한 느낌이다.
또한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수연아!” “영일아!” 하며 이름을 불러주는
동기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따지고 보면 세상 그 어디에 피붙이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을까.
설핏 위안이 되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언제까지 허락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아직까지는 모두 그럭저럭 건강한 편이지만
언니 오빠들은 모두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는 지공세대가 되었으며
막내도 어느덧 오십 줄에 들어섰으니 괜한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형제들과 자주 어울려서 밥 먹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더욱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다.
어느 새 시원한 밤바람이 바베큐 화로의 연기를 다 몰아냈다.
따라서 술자리도 끝나고 차분히 담소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는데
누군가 자정이 넘었다는 말 한마디에 갑자기 돌아갈 채비들을 하였다.
“아니, 모두들 자고 갈 것처럼 그러더니 왜들 이래...”
“말이 그렇지, 이 많은 식구들이 어디서 다 자누?”
나는 재빨리 내려가 냉장고에 준비해 두었던
야채봉지를 꺼내와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언니들은 잘 먹고 가는데 뭘 싸가기까지 하느냐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말보다 손이 먼저 나왔다.
내가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한줌씩 나누어 줄 때의 벅차오르는 기쁨이
이날은 몇 배로 더 컸다.
남편이 마무리로 노래를 부르자고 했다.
아무래도 그냥 보내기가 서운한 모양이다.
“형님들, 우리 노래 한 곡 부르고 헤어집시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노랠 부르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할지 모르니까
모기만 한 목소리로 조용히 부릅시다. ‘고향의 노래’ 다 알지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 ~”
남편도 취한 모양이다.
나는 한밤중에 뜬금없이 무슨 노래냐고 만류했건만
언니 오빠들은 군말 없이 잘 따라 불렀다.
아, 행복해! 라는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새어 나왔다.
비록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고향은 아니지만
형제들과 한때나마 웃음꽃을 피웠던 이날의 옥상 파티는
모두의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