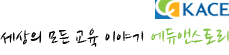비가 그립다
|김경집| 완보완심 2012. 7. 2. 10:17도무지 끝 모를 가뭄에
대부분의 저수지까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아주 예전
물을 가둬두기 전에
사람이 살던 마을의 잔해까지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쬘 만큼
최악의 가뭄입니다.
나무는 그래도 단단하게
땅 속 깊이 박은 뿌리 덕택에
아직은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풀들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미 근처에 있는 너른 목장의 초지도 마치 늦가을처럼 노랗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올 여름은 푸른 풀밭은 끝내 보지 못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스프링클러로 보살핌 받는 골프장을 제외하곤 말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해서 강물도 정의처럼 말라버린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어쨌거나 푸른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는 농심을 뒤늦게라도 위로해줄 수 있는 하늘의 자비를 빌 뿐입니다.
푸른색 하니 몇 해 전 인사동 선화랑에서 김춘수의 개인전을 감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수상한 혀’ 시리즈로 저를 홀딱 반하게 했던 화가여서
없는 시간 쪼개서 갤러리에 갔습니다.
당시 전시되었던 작품들은 거의 하나 같이 푸른색 일색이었지요.
이른바 ‘울트라 마린 시리즈’였습니다.
서양화가이면서 동양적 색채를 추구하는 김춘수의 작품 앞에 서있으면
청색의 단색조에 빠져 자연스럽게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당시 개인전의 그림들은 붓이 아니라 손과 손바닥을 사용해서
그린 까닭인지 화가의 호흡까지 그대로 묻어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화면이 숨 쉬고 생기가 분수처럼 솟아나는 듯했습니다.
이전의 그림이 수로 수직의 선을 촘촘하게 그려내서 빡빡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전시회의 그림은 가로 방향의 유동적인 선들을 통해 하늘, 구름, 바다 등이 연상되었습니다.
기존의 아크릴이 아니라 유화여서 그런지 약간의 윤택함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쉰을 넘으면서 40대의 치열함보다는 한결 너그러운 관조와 여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와 비슷한 연배로서 반가움도 깃들었습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수상한 혀’ 시리즈 전시회에서
어떤 이가 내뱉던 탄식이 기억납니다.
“아니, 도대체 혀는 어디에 있지? 게다가 무슨 혀가 이렇게 퍼래?”
그 말을 듣고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압권은 그이와 함께 온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저렇게 무수한 돌기가 있잖니.
그리고 ‘조스바’를 먹어봐라. 혀가 저렇게 되지 않고는 못 배기지.”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김춘수의 ‘수상한 혀’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조스바’가 떠오릅니다.
이른바 추상화라는 게 참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는 뒤에 숨어서 혹은 관람객의 등 뒤에서 얄밉게 웃고 있는 듯한
낭패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인상파전에는 사람들이 득시글 모여도 현대미술 전시회는 썰렁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현대미술에서 느끼는 낭패감의 주된 원인은 형태가 사라진 까닭이겠지요.
우리의 감상 기준이 재현미와 표현미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실 추상 혹은 비구상계열의 그림들이 형태를 버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 바탕은
‘나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인식적 표상일 겁니다.
예를 들어 책을 그린다고 했을 때 대상으로서의 책이 아니라
그 책이 나와 세상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화가의 눈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물로서의 책이 있다면 관람자의 눈도 자꾸만 책이라는 대상에만 머물기 쉽지요.
그러니 화가로서는 책을 제거해야만 자신과 세계를 이어주고
해석해주는 책의 역할을 오히려 제대로 표상할 수 있겠지요.
다만 그것을 관람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이나
감성의 공감대를 갖느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다른 각도로 해석해보라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은 늘 그렇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추상표현과 색면회화의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면
마크 로스코(Mark Rothko)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관람자와 내 작품 사이에는 아무것도 놓여서는 안 된다.
작품에 어떠한 설명을 달아서도 안 된다.
그야말로 관객의 정신을 마비시킬 뿐이다.
내 작품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침묵이다.”
오로지 색면만으로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음을 깨달은
로스코의 작품은 그 색면의 크기, 농도, 색채 모두를 새롭게 분배하여
새로운 공간, 새로운 생명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그 단순한 색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지요.
여러 겹으로 겹친 면과 거기에 가득 드러난 색은 공간과 시각을 다양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이어지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회화, 즉 형태를 재현하거나 표현하는
전통적 미술에서는 맛볼 수 없는 힘이며 가치입니다.
때론 형태를 벗어날 때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현대미술의 매력이겠지요.
뜬금없이 미술에 대해 짧은 이해를 주절대는 건 너무나 비가 그리운 까닭입니다.
참 엉뚱한 일이지요.
파란색에 대한 갈증이 갑자기 김춘수와 로스코를 떠올리게 한 모양입니다.
어쩌면 저 나름의 방식으로 지내는 기우제라고 여겨주셔도 좋겠습니다.
피상적인 현상에만 휘둘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고작해야 우리네 삶의 거죽일 뿐이니까요.
다만 현상이어도 좋고 피상이어도 좋으니 제발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 쏟아지는 작달비를 무념무상하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 로스코의 그림 한 점을 덤으로 선물합니다.
오늘의 그림은 거창한 해석 다 떨구고 그냥 기우제의 부적쯤으로만 여겨도 좋겠습니다.
'|김경집| 완보완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엄마, 학교 가고 싶어요! (0) | 2012.11.01 |
|---|---|
| 당신과 함께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0) | 2012.08.17 |
| 책 한권 챙기셨나요? (0) | 2012.06.19 |
|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너나 혼자 아파보세요! (0) | 2012.05.07 |
|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을 놓치다 (0) | 2012.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