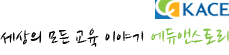30세 연상 김동리와 결혼한 여인, 서영은의 ‘살아낸 사랑’ <꽃들은 어디로 갔나>라는 책은
올봄에 나온 서영은 씨의 자전적 소설이다.
그녀는 소설가이면서 우리나라 문학의 거장인 김동리 선생의 세 번째 부인이기도 하다.
당시 김동리의 연애사와 결혼생활은 파란만장했고 그의 작품만큼이나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신랑 나이 74세, 신부 나이 44세로 시작한 그들의 상처투성이 결혼 생활은
당시 매스컴을 통해서 비교적 소상히 알려졌다.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사실 1987년에 결혼해서 1990년에 김동리 선생이 쓰러졌으니 결혼생활이 길지는 않았다.
이 책은 고작 3년 남짓한 시간에 벌어진 일들을 쓴 글인데,
서영은 씨 나이 칠십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객관화 시킨 것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서영은의 열혈 독자이다.
작품은 물론 인간 서영은도 좋아한다.
우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 박완서를 닮은 겸손한 외모가 맘에 든다.
요즘 가볍고 경박한 글이 넘치는 마당에 고뇌하는 작가로서의
치열성과 진정성이 강하게 녹아있는 그의 글은
그래서 더욱 돋보이고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머리가 아닌 경험과 끝없는 자기성찰에서 불러오는 글,
그녀의 구도자 같은 삶과 거의 일치한다.
아마도 작가의 치열함으로 따지자면 <혼불>의 작가 최명희 씨에 버금가리라 본다.
한편 ‘왜 그녀는 서른 살 차이나 나는 김동리 선생과 결혼을 했을까?’
‘전처 자식들과의 재산분쟁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 등등
평소 작가에 대한 나의 저급한 호기심도 많았는데
책에서 작가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 은밀함을 나는 야금야금 즐길 수 있었다.
더하여 서영은의 장편으로는 14년 만에 나왔다고 하니 이번 <꽃들은 어디로 갔나>는
이래저래 반가운 책이었다.
문단에 데뷔하기 위해 글을 들고 찾아간 이십대 초반에 김동리 선생을 만나고
그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너무도 험난한 삶을 살았던 서영은,
그는 30대에 혜성 같이 나타나 1983년 <먼 그대>라는 작품으로
이상 문학상을 받은 화제의 여성작가였다.
그런 그녀에게 김동리 선생과의 만남은 생의 가시밭길에 제 발로 뛰어든 형국이었다.
책에는 작가의 인고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나이 칠십에 쓴 이 작품은 가장 아프게,
가장 나중까지 울면서 쓴 마음자세의 결과라고 고백했다.
김동리의 두 번째 아내 역시 소설가였다.
손소희 여사로 그녀는 서영은과 모녀 같은 신분을 유지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서른 살 아래의 젊은 작가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암환자로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손 씨는 그들의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 선생은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니 네가 잘 돌봐드려야 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1987년 손소희 씨는 세상을 떴다.
서영은 씨는 이때부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견디며 아슬아슬한 결혼생활에 돌입한다.
오랜 연애기간을 청산하고 두 사람은 서울 정릉에 있는
봉국사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절 마당은 소리마저 쓸어낸 듯 적막했고 하객이라곤 서영은의 노모와 이모,
그리고 운전기사가 전부였다.
신랑과 신부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날들에 대해
스님이 하시는 주례사를 엄숙하게 듣고 있었다.
아마도 이날 74세의 신랑은 팔순의 장모에게 떳떳치는 못했으리라.
누구에게 축복 받는 결혼식도 아니고,
죽은 아내의 무덤의 떼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서둘러 한 혼인이기에
만일 새 아내를 맞은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축복은커녕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다.
더구나 그에게는 전처 자식이 다섯이나 있지 않은가. 그것도 아들만 다섯.
그래도 노모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말을 남기고 결혼식 이틀 만에
아들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그도 그럴 것이 딸이 이십 대에 만나 사십을 훌쩍 넘긴 마당이니
두 사람이 냉수라도 떠놓고 어서 식을 올리라고 성화를 해대던 어머니였다.
노모의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하지만 그들의 빛나던 사랑은 결혼이라는 현실 생활 안에서 점점 비참해졌다.
막상 결혼하여 한집에 살다보니 가슴 떨리게 하던 연인은 온데간데없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노인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연인과 남편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다.
남편은 잔소리꾼에다가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고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의 월급까지 깎아내리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구차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삶이 참 두렵구나!’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혼자 살 때가 훨씬 행복했다.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반야심경’을 따라 읽는 것.
작가는 나중에 자신의 사랑을 ‘살아낸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사랑이 주는 아름다움과 설렘 뿐 아니라
스러지는 고통과 슬픔까지도 함께 끌어안고 가야하는 사랑이었기에...
언젠가 4박5일의 잠적 여행 끝에 돌아온 사람에게 김동리 선생은 손찌검까지 했다.
헤어지고 싶었다는 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아든 주먹세례.
코에서는 피가 흘렀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때렸다.
하지만 그녀는 매를 피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기뻤다고 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운명의 확인이었다.
‘그래, 견디어 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어 내리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그녀의 운명을 재차 확인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과연 학창시절에 <무녀도> <등신불> <사반의 십자가> 같은
주옥같은 작품으로 만났던 김동리라는 소설가가 고작 이런 인간이었단 말인가,
라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그 자신의 개인사가 한국 문학사와 궤를 같이 하고,
여러 예술 단체의 굵직굵직한 장도 많이 맡았던 그가 과연 한국의 대작가이며
그토록 사회적 경륜이 화려한 인물이 맞는지, 매우 혼란스러웠다.
일상생활에서 남편의 행동, 남편의 말에 적이 실망할 때마다
작가는 전처인 손소희 여사를 떠올렸다.
그는 어떻게 이 수모를 견디고 살았을까,
또한 이 세상에서 아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다른 많은 여성들도 떠올렸다.
지금도 많은 부부들이 떫은 감정과 슬픔은 속으로 다 감추고 겉보기만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김동리 씨는 말년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술상을 차려놓고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술자리를 갖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잔이 몇 순배 돌고나면 항상 그가 하는 말이 있다.
“나는 다 가진 사람이오. 첫째 아내는 자식을 줬고, 둘째 아내는 재산을 줬고, 셋째 아내는 사랑을 줬어요.”
이렇듯 그는 나이로 인해 세상일로부터는 ‘귀거래’했으나 그의 여생은 도연명보다 더 풍성한 듯했다.
본인 말대로 아무 부족함 없어 보이던 그가 갑자기 의식의 절벽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어느 여름날 뇌졸중으로 쓰러져 길고 긴 병원생활로 가게 된 것.
이로써 서영은 씨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었다.
부인을 제쳐두고 평소 왕래가 없었던 전처 자식들이 나타나 온갖 참견과 결정을 다해버린다.
병원을, 의사를, 수술을, 간병인을 그들이 다 정하고 새어머니는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녀가 남편과 살았던 집마저 빼앗는다.
그리고 이어진 끝없는 재산분쟁.
그 과정은 당시 신문에도 여러 번 났었다.
사실 1987년에 결혼해서 1990년에 김동리 선생이 쓰러졌으니 결혼생활이 길지는 않았다.
고작 3년 남짓한 시간에 벌어진 일들인데,
서영은 씨 나이 칠십이 넘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객관화 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담담함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작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비슷한 연배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30년의 나이 차 때문에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나는 공감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의 단서였을 거라고.
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서른 살 나이 차의 유부남과의 사랑도 작가에게는
평생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 같다.
작년 2013년은 김동리 선생이 탄생 100년이 되는 해였기에
자연스럽게 지면에서 그의 삶과 문학을 재조명해 볼 수 있었다.
김동리 선생과 서영은 씨가 맺은 인연의 시작은 ‘불쌍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었다.
인연을 통해 선생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 사랑!
어쩌면 이 측은지심은 마음결 고운 작가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같기도 했다.
김동리 선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에 앉은 이후 이야기는
앞으로 2,3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나는 몹시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다.
작가의 불행이 계속 가슴 아프게 이어지면 어쩌나 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