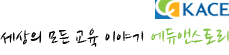겁 없이
또 한 권의 책을 엮었다.
내 이름을 달고 나온
세 번째 책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이번에는 주변의 반응이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와
문자로 격려를 해주었고
이메일로 독후감을 써준 사람도
서넛 있었다.

싱가포르에 사는 여동생은
습작 같은 치졸한 산문집 수준에서 벗어나
글이 많이 세련되었다고 전화로 말해 주었다.
아랫사람으로서 조금 건방진 발언 같았으나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책이 나오고 나서 맨 처음의 독자는
가족이었다.
남편은 백 권이 넘는 책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출판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던 터라
그는 정말 부담 없이 책을 돌렸다.
추가 주문도 받아 왔다.
작년 12월3일에는 남편의 고교 동창 송년 모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주어
저자 사인회도 가졌다.
나중에 거기서 걷힌 책값을
동창회 장학금으로 내놓으면서
남편은 꽤나 으쓱해했다.
큰딸도 30권만 사겠다면서
책값을 부쳐왔다.
우리 엄마가 책의 저자라고 뻐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단다.
헌데 유독 작은딸만은 시종 무관심으로 일관.
이유인즉슨 책 속에 등장한 자기의 술 취한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해서 망신스럽기 짝이 없단다.
왜 엄마는 그런 얘기를 자기 허락도 없이 썼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엄연한 초상권 침해라나 뭐라나.
그 후 1월 중순 쯤,
재미있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평소 알고 지내던 권사님인데
자기 남편이 내 책을 읽고 나서
저자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단다.
뜻밖의 제안이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유명작가도 아니고
또한 나를 만나면 남편의 환상이 깨질까봐 걱정된다며
나름대로 재치 있게 거절한다고 했건만
거듭된 요청에 결국은 수락하고 말았다.
며칠 후 우리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깔끔한 인상의 그 남편분은 말수는 적었지만
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오랫동안 시를 썼다고 했다.
그는 내 책 내용은 물론
우리 딸들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책읽기가 아까워서
단숨에 읽기보다는 한번에 네 편씩 아껴가며
읽었노라고 수줍게 털어놓았다.
아,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으랴...
사실 이번 책 출판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딸의 혼사준비,
어머님의 수술과 장기 입원 등으로
글 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게다가 같은 자세로
긴 시간을 컴퓨터와 함께 하다 보니
목 디스크까지 걸려
근 석 달 간 물리치료까지 받았다.
어쩔 수 없이 글쓰기는 당분간 접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날의 황홀한 칭찬에 힘입어
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고 말았으니
실로 성취가 주는 마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앞으로 권사님은 빠지시고 우리 둘이서만 만나면 안 될까요?”
하고 내가 농담을 건넸더니
그분은 그건 절대 안 된다며 정색을 하는데
옆자리의 부인은 몹시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응수한다.
“아휴, 우리 남편 순진하시기는...”
책 출판 후,
가장 획기적인 일은
안사돈으로부터 받은 책 주문이었다.
딸아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사돈과 함께 한 자리였다.
상견례이후 두 번째 만남이어서
아직은 많이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안사돈이 갑자기 책 얘기를 꺼내는 거였다.
아들이 가지고 있던 내 수필집을 빌려 읽으셨단다.
“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제가 소현이 어머니 책을 읽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댔어요.
한 20권쯤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재고가 없다지 뭐에요.”
뜻밖의 발언에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라서 잠시 생각하는 사이 딸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책 많이 있어요.”
어떻게 집에 책이 많이 남았냐는 질문에 딸은 또 말했다.
“안 팔린 책이 박스 가득 있다니까요.”
아, 이럴 땐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
또 여러 사람들이 물었다.
책은 많이 팔렸는지,
비둘기 소동에 나온 그 비둘기들은 어찌 되었는지,
남편은 아직도 줄기차게 택배를 시키는지,
등등 궁금한 게 많았나 보다.
한편 내용이 중복되어서
책의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고마운 충고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재미있었다고 했다.
보통 수필이 재미없다고들 한다.
‘사실의 재현과 전달’이라는
수필 본래의 정의와 성격에 갇혀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다.
소설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말은 수필에게도 해당된다고 본다.
지나치게 논리적이며
추론적인 수필은 독자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사랑, 끝나지 않은 여정>은
대충 읽을 사람들을 고려해서 지루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했다.
가능한 대로 꾸미지 않고 쉽게 썼다는 얘기도 될 터인데
만일 누군가가 신변잡기에 불과한 글이라고 혹평을 해도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네 삶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던가.
세상 모든 생명이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은
나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 격려와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호들갑스럽지 않고 억지 꾸밈도 뽐냄도 없는 잔잔한 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더러 공감해준다면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
어느 수필가가 말했다.
‘수필은 솔직하면 창피하고 감추면 의미가 없다’고.
속을 다 드러내고도 부끄럽지 않을 경지에 이른 인격이라야
비로소 수필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종(鍾)이 좋아야
좋은 소리를 울리듯
마음이 넓고 맑아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본다.
인생의 경지가 곧 수필의 경지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는가.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공부와 더불어 마음 밭을 가꾸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사인해서
준 책을 오래오래 간직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