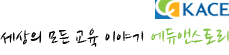이제 31개월이 된 손녀는 작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곳은 딸의 회사 내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라서
아침에는 딸이 출근할 때 태워서 가고
오후 네 시가 되면 친할머니가 데리러 간다.
외할머니인 나는 매주 수요일만 담당,
만일 양쪽 할머니 둘 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종일반에 있다가
딸이 퇴근하면서 데리고 오기도 한다.
수요일 오후 4시, ‘이 녀석이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반길까?’
일주일에 한번씩 늘 되풀이되는 일인데도
아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고 출렁거린다.
어린이집에 들어서니 친구들과 풍선 날리기를 하고 있던 지우는
나를 보자마자 단숨에 달려와 안긴다.
오늘은 외할머니가 지우 데리러 오는 날이라고
아침부터 선생님한테 자랑을 했단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인지 밥도 잘 먹고
야외활동도 잘 했다고 선생님이 전해준다.
집으로 오는 길,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지우는
갓 깬 물총새처럼 쉴 새 없이 조잘거린다.
오늘 간식은 뭘 먹었는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응가를 몇 번 했는지...
특히 선생님 흉내를 내는 말투는 몇 번이나 폭소를 터트리게 했다.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할머니는 참 멋진 친구 같애!”
“아니, 할머니보다 지우가 더 멋진 친구지?”
“맞아, 할머니랑 지우랑 똑같이 멋진 친구야!”
세 돌이 채 안 된 아이는 이제
그 누구와 대화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어휘를 익혔다.
냠냠 밥을 먹고, 쿨쿨 잠을 자고,
살금살금 걸어간다는 표현은 어디서 배웠는지
의성어 의태어도 제법 쓸 줄 안다.
집에 오자마자 주방놀이 세트를 가져와서는
할머니에게 커피를 타주고 장난감 냉장고에서 빼빼로 과자도 하나 꺼내 주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쉿!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며 제법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왜 비밀이냐고 물었다.
아빠가 빼빼로 많이 먹으면 이빨에 개미가 생긴다고 했단다.
아이고, 웃겨라... 이렇게 지우와 대화를 나누다보면
아기자기한 즐거움이 곳곳에 별사탕처럼 숨어있다.
저물녘의 해 그림자가 넓게 퍼진 거실에서
이번에는 지우가 퍼즐 삼매경에 빠졌다.
42피스짜리 뽀로로 퍼즐을 엎었다가 다시 맞추고 반복하기를 세 차례,
놀라운 집중력이다. 지겹지도 않나 보다.
“할머니는 하나도 못 맞추는데 김지우는 진짜 잘 한다!”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니 아이의 표정이 금세 환한 봄날이 된다.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아이의 충만감이 내 몸에도 고스란히 스며드는 느낌,
실내의 따뜻함과 평화가 더해져 더욱 행복한 시간이다.
나는 아이의 움직임으로 시간을 잰다.
태어나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고, 노래하고, 책을 읽고,
이 모두가 지우가 태어난 후 31개월 동안 나타난 일들이고 시간의 잣대가 된다.
갑자기 <first of May>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어릴 적 나는 크리스마스트리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문득 나무보다 내가 훌쩍 커버렸어요’ 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지금 아이 방에는 기린 모양의 키 재기 그림이 붙어있다.
딸은 수시로 아이를 거기 서게 하고 연필로 빽빽하게 점찍어 두었다.
연필 자국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간도 조금씩 흘러 어느덧 천 일,
천 일 동안 지우는 참 많이 컸다.
몸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배움도 자랐다.
선생님과 친구를 알게 되었고 질서와 규율도 배웠다.
거실에는 첫돌, 두 돌 때 찍은 가족사진도 붙어있다.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세 번째 가족사진이 붙게 되고
갓 태어난 지우 동생 사진도 나란히 걸리게 될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뿌듯하다.
저녁에 딸이 퇴근해서 오면 지우와 헤어질 시간이다.
만나러 오기는 쉽지만 떠나기는 쉽지가 않아 헤어짐에 다소 복잡한 과정이 따른다.
“할머니, 가지마! 지우 집에서 자고 가.”
울먹이며 말하는 아이에게 나는 짐짓 더 명랑한 소리로 화답한다.
“할머니, 두 밤 자고 또 올 테니까 오늘은 엄마하고 코 자라.
리 지우 착하지?” "“지우야, 우리 어린이집 안 가는 날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할머니 집에 가자아~” 제 엄마도 거든다.
나는 아이를 살포시 껴안고 이마에 눈에 빰에 뽀뽀를 해준다.
“지우 잘 자!”
아이는 안심한 듯 얼굴에 다시 평온이 깃들며 힘차게 손을 흔든다.
“할머니, 안녕!”
이렇게 손녀와 함께 한 시간은 하루도 아니고 불과 네 시간 남짓이다.
이 짧은 시간이 그토록 복잡한 일상의 시간을 다 태워버리고
또 만날 날을 그리워하게 만드니
나는 딸 바보가 아니라 손녀 바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