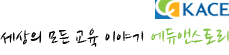미국에 사시던 친정어머니가
7년 만에 돌아오셨다.
90세의 어머니는 너무나 쇠잔한 몸이었기에
언니와 형부가 LA까지 가서 모시고 왔다.
칠남매가 차례로 생명을 싹틔우고 깃들었던 몸,
구십여 년의 고단한 행보.
어딘가 알 수 없지만,
떠나온 곳으로부터 되돌아가기 위해
어머니는 아주 조그마한 몸으로 고향땅에 오신 것이다.

불과 몇 해 전 내가 동생네 가서 만났을 때만 해도
어머니는 건강하셨다.
그때도 유월이었다.
미국의 찬란한 아침 햇살 아래 싱그런 유월의 바람과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는 동생네 집 그 초록빛 잔디밭,
여전히 빨간 립스틱과 메니큐어를 바른 팔순의 코리언 할머니는
셋째딸인 나를 보고서 반갑게 소리쳤다.
“어서 오너라!”
힘찬 목소리와 더불어 더 이상 희어질 여분도 없는
어머니의 은빛머리는 기다림의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 머문 보름동안 어머니는
외식할 때 빼고는 한국에서보다 더 한국적인 음식으로
매끼 식사를 차려내셨다.
하지만 무정한 세월 앞에 이제는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날씨가 조금만 변덕을 부려도 겁을 내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위해 자식들은 해드릴 게 별로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게다가 오빠 언니들은 이미 칠십 세가 넘었으니
그들 또한 어머니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노인네가 아니든가...
고령화 사회가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네 딸 중에서도 나는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았다.
외모와 식성도 그렇지만 전화 목소리가 똑같아서
예전에 한 집에 살 때 벌어진 에피소드가 참 많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받으면
십중팔구는 내가 장난치는 줄 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좀처럼 믿지를 않았다.
또 남들은 좋게 말해서 겸손하다고 하지만
남에게 싫은 소리 절대 못하고
소심하고 숫기 없는 행동거지도 많이 비슷했다.
젊었을 적엔 엄마를 쏙 빼닮은 이런 성격이
스스로 생각해도 답답할 때가 많았다.
차라리 화통하고 뒤끝 없는 아버지를 닮았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이 또한 나이가 들면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지금에 와서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걸 보면
사람의 성정이란 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칠순 팔순이 되어도 나의 기원(起源)인
현재 우리 어머니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리라.
그런데 정작 어머니를 꼭 닮았으면 좋았을
손재주가 내겐 없으니 뭔가 불공평한 것 같다.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 뜨개질 하는 모습이다.
내가 꼬맹이 때부터 시집 올 때까지
이십여 년 넘게 봐온 너무도 익숙한 광경.
안방에는 알록달록한 털 뭉치가 굴러다녔고
어머니 손에는 항상 털실과 코바늘이 들려 있었다.
가끔씩은 나와 동생을 앉혀놓고
양손에 털실을 걸게 하고는 풀었다 감았다를 반복하셨다.
또한 마루 난로 위에
올려진 주전자에서는 언제나 물이 끓었고
그 주전자에서 나온 하얀 김에 털실을 쐬면 주름살이 다 펴졌다.
그 실이 엄마의 손을 거치면 알록달록 조끼가 되고
스웨터가 되고 방석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커다란 이불보까지 탄생되었다.
그래서 넷이나 되는 딸들 시집 갈 때 혼수품목으로
꼭 엄마표 이불과 방석이 빠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했다.
결혼 삼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집 장롱 속에 고이 모셔져 있는
털 이불을 보면 온천수처럼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진다.
당신이 평소 자식들에게
“늙으면 썩어질 몸뚱이, 아끼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여라!”라고
강조했듯이 어머니는 잠시도 가만있지를 않으셨다.
미국에 계실 때도 화초와 텃밭을 열심히 가꾸어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일주일에 두 번은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만두 만들기 봉사를 하셨다.
어디 만두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인가,
한국 주부들도 마트에서 사다 먹는 그 손 많이 가는 음식을
노인네들이 직접 빚어 교회 기금을 마련한다는데
그 중심인물은 언제나 우리 어머니셨다.
이렇듯 부지런하고 에너지 넘치던 그 분은
이제 워커에 의존하지 않고는 걸을 기력조차도 없으시다.
아마 날이 갈수록 엄마의 서있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리라.
지난주, 싱가포르에 사는 막내딸도 엄마를 보러 한국에 왔다.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엄마와 네 딸이 함께 밥을 먹었다.
같은 곳에 살지 않는 엄마와 딸들,
따뜻한 밥에서 풍겨 나오는 기분 좋은 냄새,
반찬을 놓아주는 엄마의 손과 가끔씩 터져 나오는 잔소리.
아, 얼마나 그리웠던가...
영양가 없는 수다가 밤새 이어졌고
이날 우리 딸들은 거의 고혈압 수준으로 흥분하여
“오우, 우리 엄마 열라 멋져!”를 외쳐댔다.
싫지 않은 듯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순진한 웃음이 꽃처럼 피어났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 띤 어머니 얼굴...
내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다.
정채봉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란 시다.
젖먹이 때 엄마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시인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시라고 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단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입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
한 명의 아이를 온 열정을 바쳐
평생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오직 부모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www.kace.or.kr
KACE 부모리더십센터